2024 노근리평화기념관 특별기획전 <서용선;노근리 + 너머>
2024 노근리평화기념관 특별기획전
○ 오는 27일부터 내년 4월 27일까지 노근리평화기념관 특별기획 <서용선; 노근리+너머> 전시 개최
○ 한국의 역사적 사건을 현대미술의 다양한 매체로 창작하여 시각화 해 오고 있는 서용선 작가의 시선으로 본 노근리 사건과 사건현장 작품 40여점(회화, 조각 등) 전시
○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의‘노근리 사건’작품 창작에 대한 탐구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아카이브 섹션 구성
○ 노근리 사건의 교훈인 인권과 평화의 가치 존중이라는‘노근리 정신’이 서용선의 작품세계를 통해 더 널리 확산되어지는 계기 마련
Ⅰ. 전시개요
1. 제목: 2024 노근리평화기념관 특별기획전 <서용선; 노근리+너머>
2. 기간: 2024.11.27.(수)~2025.4.27.(일)
3. 장소: 노근리평화기념관 전관
4. 참여작가: 서용선(1951년~ )
5. 전시평론: 정영목(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갈홍(요크대학교 교수, 캐나다 토론토)
6. 작품내용: 회화(33점), 조각(5점), 아카이브 자료(50여건) 등
7. 부대프로그램: 전시연계프로그램(1월~2월), 라운드테이블(2월) *별도공지
8. 관람안내:
- 관람시간: 3월~10월 09:30~17:30 11월~2월 10:00~17:00
- 관람료: 무료
- 휴관일: 매주월요일, 1월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휴관
Ⅱ. 전시소개
노근리평화기념관(관장 정구도)은 특별기획전으로 한국 현대미술의 대표작가인 서용선(1951년~ 서울생)의 <노근리+너머>를 2024.11.27.(수)부터 2025.4.27.(일)까지 (5개월간) 개최한다.
한국 역사의 중심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는 권력의 부조리와 모순, 정치․사회 현상 등을 작품 창작의 주요 모티브로 하여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서용선은 1980년대부터 한국전쟁에 관한 그림들을 본격적으로 그려왔다.
이번 전시는 서용선이 1999년부터 현재까지 약25년 동안 관심과 탐구의 열정으로 그린 노근리사건과 사건현장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 파병들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피해자들이 당시 겪었을 상황이 서용선의 작품을 통해 이미지로 시각화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용선의 역사화가 가치 있게 평가되고 있으며 한국미술사에 있어서도 족적이 분명한 예술세계가 될 것이다.
노근리평화기념관 전관에서 펼쳐지는 서용선의 작품 전시는 유화와 드로잉, 조각 등 총40여점의 작품과 아카이브 자료 전시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전시를 위해 최근 제작한 신작 작품들에서는 노근리사건 희생자들이 쌍굴다리에서 지냈을 나흘간의 공포와 피난길 여정을 공감하는 인간적인 연민의 시선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이번 전시의 평론을 쓴 정영목(서울대 명예교수)은 서용선의 역사화에 대하여“서용선은 이미 6.25전쟁 전반에 관한 공적인 정치, 사회의 국제정세를 비롯, 또한 화가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지극히 사적인 사건까지도 작품으로 제작했으니,‘노근리’ 말고도 화가의 ‘역사화’에 대한 관심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미 오래전 형성된바, 단순히 관심이라 말하고자 하는 수준과 경지를 넘어 우리 현대미술사에서 다루어야 할 매우 독보적인 한 분야로 본격적인 연구의 대상으로까지 떠올랐다.”고 평하고 있다.
<서용선; 노근리+너머> 전시를 통해 노근리사건의 교훈인 인권과 평화에 대한 가치 존중이 개인과 사회로 확장됨은 물론 모든 이들의 일상에 스며들기를 바란다.
한편, 노근리평화기념관은 노근리특별법에 의해 조성된 노근리평화공원의 인권과 평화에 관한 전시, 연구, 조사, 교육, 출판 등의 활동을 위해 2011년 10월27일 개관하였으며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이사장 정구도)이 운영 관리하고 있다.
노근리평화기념관 건축물은 2013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의 기념전시관, 현대미술관, 파빌리온을 설계한 故이종호 건축가가 설계했다.
Ⅲ. 작가소개
서용선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서울의 변두리에서 태어났다. 도시며 농촌이며 거의 모두가 폐허가 된 암울한 시기에 어린시절을 보내야 했던 그는 전쟁과 가난으로 인해 피폐해진 인간들의 일상을 경험했고, 피난의 비극을 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어른들에게 들은 저마다 다른 언어들의 이야기들은 서용선에게 그려야 할 이미지로 다가왔다.
1970년대 말부터 전후의 심각한 사회적 상황을 인식하고 정치와 사회문제를 본격적으로 예술표현의 주제로 삼기 시작했다. 인간적 주제와 인간의 구체적 형상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조형적 실험들이 이어졌으며, 1980년대 중반에 그린 단종 이야기 작품은 인간의 권력 욕망과 그 비극성에 대해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서용선이 그리는 역사화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단초가 된다.
1999년부터 그리기 시작한 한국전쟁에 대한 그림은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되었다. 어린시절 궁금했던 당시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이해와 소회라고도 할 수 있다.
서용선은 아르코미술관 대표작가(2016), 이중섭미술상 수상(2014),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 선정(2009)등 이미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했으나 여전히 미국 버몬트 및 뉴저지, 호주 시드니 등에서 레지던시를 경험하며 끊임없이 창작의 스펙트럼을 확장시키고 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과 동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서용선은 2008년 돌연 서울대 미대 교수직을 그만두고 전업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경기도 양평의 작업실과 서울, 미국, 호주 등 전 세계를 작업장 삼아 노마드적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의 작품들은 현재 한국의 국․공사립미술관을 위시하여 대학박물관, 호주, 일본, 싱가폴의 유수한 기관에 소장되어있다.
Ⅳ. 대표 작품 소개

서용선, 노근리, 2019, Acrylic on Linen, 400x990cm.
Suh Yongsun, Nogunri, 2019. Acrylic on linen, 400 x 990cm.
한국전쟁의 기억을 그리다
갈홍(요크대학교 교수, 캐나다 토론토)
서용선의 그림들은 한국전쟁의 공식 서사에서 간과되거나 배제되어 온 민간인에 대한 전쟁, 혹은 “또 다른 전쟁”을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근리>라는 제목의 두 작품은 1950년 7월 미국 군대가 노근리 마을에서 주로 어린이, 노인, 여성 등 수백 명의 피난민을 학살한 사건을 다룬 것이다.
1990년대 중반,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 중 처음으로 공개된 사례 중 하나였으며, 그것은 서용선으로 하여금 전쟁의 트라우마를 더욱 깊이 있는 비판 정신으로 되돌아보게 했다. 2001년에 그려진 첫 번째 <노근리> 그림은 한 남성과 어린아이들이 무력하게 몸을 숨기고 있던 철교 벽에 남은 총알 자국과 전투기의 그림자가 암시하듯,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에 비명을 지르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다. 이 그림은 노근리 학살의 충격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
더욱 확대된 규모와 세밀한 묘사로 2019년에 전시된 두 번째 <노근리> 그림은 피난민들이 철교 아래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중 지상과 전투기에서 쏟아진 기관총 사격으로 희생당하는 학살의 장면을 그리고 있다. 이 두 번째 <노근리> (2019作) 그림은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고, 회의를 진행하며, 학살을 지켜보는 가해자들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의도적인 행위였던 이러한 학살에 대한 가해자들의 책임을 시각적으로 부각시킨다.
사건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학살은 단순히 비극적 사건이 아니었으며, 비상사태라는 이름으로 비무장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미군의 작전은 결국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잘못이었음이 드러났다. 서용선의 이 작품은 그것을 묘사한 것이다. 미군이 민간인 학살에 책임이 있었지만, 실제 가해자 대부분은 “빨갱이 사냥”이라는 명분으로 국가가 조직적으로 자행한 테러에 동원된 한국인들이었다.
원문출처:“Painting the Korean War Traumas,” in Transposed Memory: Visual Sites of National Recollection in Twentieth and Twenty-first Century East Asia, co-edited by Alison J Miller & Enyoung Park, Brill Press 2024, pp. 74-89
Ⅴ. 작품평론(요약본)


노근리사건 Nogunri Massacre,2001 노근리 Nogunri 1999,
캔버스에 유화 종이에 아크릴, 파스텔
Oil on canvas 250x200cm Acrylic, Pastel on paper, 76.2x55.6cm
그림으로 보는 ‘노근리 학살’
정영목
서울대 명예교수
서용선은 ‘노근리 학살’을 주제로 지금까지 두 작품을 제작했다. 첫 작품은 2001년의 <노근리 사건(Nogunri Massacre), Oil on canvas, 250x200cm>이고, 다른 하나는 2019년의 <노근리(Nogunri), Acrylic on linen, 400x990cm>다.(1) 두 작품 모두 대작이지만, 2019년의 <노근리>는 가로의 길이가 무려 10m에 육박하므로 펼치면 마치 연극의 무대장치용으로 직접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두 작품 모두 ‘역사화’로써 ‘학살’의 정황을 읽을 수 있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두 작품 모두 화가가 즐겨 구사하는 조형적 요소들을 화면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만 2019년의 <노근리>는 그 규모에 걸맞게 ‘학살’을 당하는 ‘쌍굴다리’의 양민을 중심으로 시간과 공간이 다른 미군들의 전시행동을 유추할만한 인물들을 한 화면에 동시에 배치해놓음으로써 무언가 계획적이고 암암리에 사건이 진행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1) 2001년의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특별전: 기억/재현 서용선과 6.25,” 고려대학교 박물관, 2013. 6.25 ~ 8. 25일에, 2019년의 <노근리>는 “통증, 징후, 증세: 서용선의 역사그리기,” White Block Art Center, 2019. 10. 10 ~ 12. 8일에 전시했다.
반면에 2001년의 작품은 그 구성이 보다 간결하되 표현적이다. ‘쌍굴’의 모티브를 부분적으로 활용하되 미공군의 전투기와 기총사격이 상징적으로 강조되었다. 짙은 회색빛 다리 표면에 과장된 크기의 전투기 동체, ‘아치형(arch)’ 쌍굴을 강조하기 위한 빨강 사선들과 초록 배경의 대비효과, 섬뜩한 총알 자국, 고통과 공포의 아이와 어른이 매우 표현적이다. 이 작품의 초기 구상이 보이는 드로잉(노근리 Nogunri 1999, 종이에 아크릴, 파스텔 Acrylic, Pastel on paper, 76.2x55.6cm)에 화가는 ‘1999. 10. 31’로 제작 날짜를 표기했다. 이때는 한·미 양국정부의 노근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실시되었던 시기로 화가 서용선이 ‘노근리’ 주제의 작품을 제작해야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던 때로 추정된다.
한편, 2019년의 <노근리> 작품 이야기를 형식의 측면에서 조금 더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잠깐 밝혔듯이 2001년의 작품과 비교하여 이 작품은 보다 서사적이다. 때문에, ‘학살’의 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다. 사건의 실체를 보다 적극적이며 직접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화가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작가는 기존의 ‘표현’과 ‘상징’보다는 회화가 언어보다 관람자에게 직접 용이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실과 기록으로서의 작품을 의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선, 화면 전체의 구도는 온전한 쌍굴이 그 주위를 둘러싼 기하학적 평면의 패턴으로 대칭을 유지하며 처리되어 있다. 쌍굴다리에 모여있는 희생자들의 숫자가 월등히 많아졌고, 전투기 두 대의 공습이 총알 자국의 점들로 그려졌다. 아울러 각기 다른 그룹의 미군들이 왼쪽 화면 상단과 오른쪽 위 아래에 포진해 있다. 엎드린 두 병사는 쌍굴을 향한 기관총 사수일 것이고, 무언가 모의를 작당하는 듯한 사령부의 장성들과 사격의 좌표를 지도로 읽는 듯한 병사도 보인다. 전자의 작품이 ‘압축’과 ‘표현’이라면, 후자의 작품은 ‘서술’과 ‘재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주제를 접근하는 작가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서용선은 이미 6.25전쟁 전반에 관한 공적인 정치, 사회의 국제정세를 비롯, 또한 화가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지극히 사적인 사건까지도 작품으로 제작했으니, ‘노근리’ 말고도 화가의 ‘역사화’에 대한 관심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미 오래전 형성된바, 단순히 관심이라 말하고자 하는 수준과 경지를 넘어 우리 현대미술사에서 다루어야 할 매우 독보적인 한 분야로 본격적인 연구의 대상으로까지 떠올랐다.
정영목, <서용선의 역사화: “노근리 학살” No Gun Ri massacre:
many from the nearby villages of Jugok-ri(주곡리) and Imke-ri(임계리)>중에서 발췌
*〔참고자료 1〕작가연보 (요약본)
1982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졸업(M.F.A)
1979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B.F.A)
주요 개인전 (2016~)
2024 서용선; 노근리+너머, 노근리평화기념관,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충청북도 영동
2023 나를 그린다 서용선, 토포하우스, 서울
서용선: 내 이름은 빨강, 아트선재센터, 서울
2022 서용선: 회상, 소나무, 갤러리JJ, 서울
2021 서용선의 생각: 가루개 프로젝트, 갤러리JJ, 서울
2021 서용선의 마고이야기: 우리 안의 여신을 찾아서, 서울 여성 역사 문화 공간 여담재, 서울
2021 만접산충(萬疊山中) 서용선 회화(繪畵), 여주미술관, 여주
2020 서용선 개인전 ‘고구려, 산수’, 갤러리 이마주, 서울
2019 서용선의 머리_갈등, 갤러리JJ, 서울
2019 통증, 징후, 증세: 서용선의 역사 그리기,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2019 서용선, 속도의 도시, Niche Gallery, 도쿄, 일본
2019 Utopia’s Delay: the Painter and the Metropolis by Suh Yongsun, Mizuma, Kips & Wada Art,
뉴욕(NY), 미국
2018 서용선의 자화상: Reflection, 갤러리JJ, 서울
2018 Suh Yongsun: City and History of the Landscape, MK Gallery, 비엔나(VA), 미국
2017 My Place, Gallery Fukuzumi, 오사카, 일본
2017 Suh Yongsun: 37 rue de Montreuil Paris / 222 main Street New Jersey, Galerie La Ville A des
Arts, 파리, 프랑스
2017 Suh Yongsun: Crossing Worlds, Art Mora Gallery, 뉴욕(NY), 미국
2016 色과 空–서용선, 김종영미술관, 서울
2016 확장하는 선-서용선 드로잉, 2016아르코미술관 대표작가전, 아르코미술관, 서울
2015 서용선의 도시 그리기 – 유토피즘과 그 현실 사이, 금호미술관/학고재갤러리, 서울
2014 서용선의 신화_또 하나의 장소 – 이중섭미술상수상 기념전,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2014 체화된 것들 – 자화상과 풍경들, Gallery Fukuzumi, 오사카, 일본
2014 역사적 상상 – 서용선의 단종실록,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2014 서용선, 독일학술교류처(DAAD), 본, 독일
2013 기억·재현: 서용선과 6.25, 고려대학교박물관, 서울
주요 그룹전 (2017~)
2023 연옥에 핀 꽃, 엑스포아트갤러리, 여수
2022 긴호흡 – 다섯 작가의 드로잉, 토포하우스 서울
정진국의 건축과 서용선·박인혁의 그림, 토포하우스, 서울
2022 미니멀리즘-맥시멀리즘-메커니즈즈즘 1막-2막, 아트선재센터, 서울
2021 DMZ이후 대지의 숨결,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2021 할아텍 철암그리기 20주년 기념전, 태백석탄박물관 기념전시실, 태백/ 목포문화예술회관, 목포
2021 여수국제미술제 ‘흐르는 것은 멈추길 거부한다’, 엑스포컨벤션센터 전시홀, 여수
2021 전방(前方): 20인의 예술가가 전하는 한반도 평화이야기, 오두산통일전망대 기획전시실, 파주
2021 시대와 개성, 해든뮤지움, 인천
2021 한국 스페인 특별전 ‘마주하는 풍경, 일상의 시선’, 소마미술관, 서울
2021 신자연주의: 리좀이 화엄을 만날 때,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2020 ㄱ의 순간,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서울
2020 열 장의 이야기와 다섯편의 시, 부산비엔날레, 부산현대미술관 외, 부산
2020 이른 봄나들이 - 예술가의 작업실, 여주미술관, 여주
2019 수원화성 프로젝트 ‘셩: 판타스틱 시티’,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수원
2019 불멸사랑, 일민미술관, 서울
2019 Microcosmo: Visioni di paesaggi contemporanei dal mondo, Museo di Palazzo Doria Pamphilj,
Valmontone, 로마, 이탈리아
2018 바다와 섬, 상하이한국문화원, 상하이, 중국
2018 A New Era of Peace and a Peaceful Land, Grebel Gallery at Conrad Grebel University College,
워털루, 캐나다
2018 We the People, Ozaneaux Art Space, 뉴욕(NY), 미국
2018 베트남에서 베를린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17 Two Reflections: Korean and American Artists Confront Humanity and Nature, 워싱턴한국문화
원, 워싱턴D.C., 미국
2017 풍경 표현, 대구미술관, 대구
2017 Commodity & Ideology, Klapper Hall Art Gallery, Queens College, 뉴욕(NY), 미국
수상
2016 아르코미술관 대표작가, 아르코미술관, 서울
2014 이중섭미술상,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2009 올해의 작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84 제6회 중앙미술대상 특선, 중앙일보, 서울
1982 동아미술제 동아미술상, 동아일보, 서울
1978 제1회 중앙미술대상 특선, 중앙일보, 서울
주요 레지던시
Torpedo Factory Art Center, 알렉산드리아(VA), 미국
Art Mora 레지던시프로그램, 뉴저지(NJ), 미국
시드니대학교 레지던시프로그램, 시드니, 호주
RMIT 대학, 멜버른, 호주
버몬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버몬트(NY), 미국
작품 소장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대구미술관, 수원시립미술관,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미술관, 고려대학교박물관, 충청대학교, OCI미술관, 모란미술관, 국방대학교박물관, 양평군립미술관, 인천아트플래폼미술관, 포스코, 동서문학, 호주 모나쉬대학교, 싱가폴 우관중미술관갤러리,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미 외 다수
*〔참고자료 2〕작가노트 (요약본)

기억과 그림 Memory and Paintings
서용선
살아있다는 것은 매 순간 무엇인가를 보고 있으며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느낀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살아간다.
그림은 그 소통의 방법들 중 하나이다. 그림은 다양한 경험과 제작과정을 통하여 물질로 드러난다.
우리는 그림 안에서 사람이나 풍경, 순수한 색들의 조합으로 내용과 느낌을 전달받는다.
작가가 다양한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그리고, 그 경험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그릴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어린 시절의 기억과 청년기의 경험은 사회 환경과 만나는 과정으로 오래 지속되기 마련이다. 전쟁이나 역사적인 사건은 그 중심에 있다.
나는 전쟁중인 1951년 한국의 수도 서울의 변두리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 당시 서울은 거의 모두가 파괴되어 변변한 건물이 거의 없었다.
어머니는 나를 낳기 위해 한강변에서 나룻배를 기다리던 긴박한 순간을 여러 번 이야기하였다. 그것은 늘 이상한 감정을 일으켰다. 전쟁 중에 고생한 부모들의 이야기는 미안함으로 느껴졌다. 나의 탄생 자체가 전쟁중의 긴장에 휩싸인 것이다.
전쟁이 끝나고 어린 시절 주변의 분위기는 집 앞의 공동묘지 근처에서 겨울이면, 추위와 생활고로 죽어 나가는 모습들을 보곤 했으며 무엇보다도 배고픈 가난이 극심한 고통이었다.
전쟁의 피해를 우려하여 지방으로 피난을 갔던 피난민들과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아예 임시 텐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먹을 것, 입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비바람을 피할 주택과 생활할 건물이 거의 없었다. 도시의 어린이들은 골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방황하였다. 도둑질이 일상화되었다. 가난은 인간을 피폐하게 만든다.
저녁에는 동네 어른들이 모여 끊임없이 피난 갔던 이야기와 전쟁에서 겪은 많은 비극적 이야기들을 하였다. 기억나는 단어들은 피난, 애기 인민군, 이승만, 맥아더, 미8군, 켈로부대, 도민증,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 1.4후퇴, 9.28 등등 이다. 어린시절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반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은 졸음을 참아가며 듣던 다른 이야기들과 함께 언어로서 간접적인 경험의 일부가 되었다.
언어는 이미지를 불러 일으킨다. 이러한 단어들은 내 몸의 일부가 되어 훗날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 환생하였다. 여러 번 반복해 들었던 익숙한 단어들은 역사적 지식으로 바뀌어 졌다. 가난과 문화적 사건이 없는 지루한 환경만이 계속되었다.
작가 활동을 하면서 전후의 사회적 상황을 점점 더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인도차이나 전쟁(1955-1975, 한국에서는 월남전이라고 칭한다)이 끝나고 국제적으로 냉전이 끝나가면서, 1980년대 한국은 오랜 군부 독재가 끝나고, 민주화운동으로 정치적 변혁기가 시작되었다. 미술에서도 현대의 정치, 사회문제를 다룬 작품들이 등장하였다.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던 식민지 국가로서의 36년과 남북한 간의 6.25전쟁을 벌인 3년 등을 겪은 한국은 문화예술이 매우 뒤쳐진 상황이었다.
정치 사회문제를 본격적으로 예술표현의 주제로 삼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라고 볼 수 있다. 시작된 것은 1970년대 말부터 이다. 한국의 경제는 1960년대부터 다시 재건되기 시작하였으며, 해방과 전쟁의 여파로 인한 군사적 독재정치는 1980년대 후반에 가서야 끝났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은 문화예술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한국에서는 미술인들의 등용문이었던 국가 주도의 국전이 끝나가고, 언론사 중심의 민전 시대가 시작되어 새로운 형상미술이 젊은 작가들의 그림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형상미술은 프랑스 신구상미술과 새로운 사진 사실주의등으로 시작 되었다.
나는 뒤늦게 미술대학에 입학하고 1979년에 졸업하였다. 1970년대부터 새롭게 소개된 인간에 대한 표현은 청소년기 소설과 영화를 즐겨 보았던 나에게 인간적 주제에 대한 표현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그리고 사회적 주제에 대한 미술 표현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 주었다. 추상미술의 이해에 대한 조형적 실험은 인간의 구체적 형상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도 하나의 가능성이 되었다.
1980년대 중반, 한국의 역사중에서도 조선시대(1392-1910) 대표적 사건인 ‘소년왕’ 단종의 이야기를 인간의 권력에 얽힌 비극적 사실로 생각하고 그리기 시작하였다. 권력 다툼으로 자신의 친족인 삼촌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은 인간의 권력 욕망과 그 비극성을 대표적으로 보여 준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6.25(한국전쟁)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이 그림들은 내 어린시절 궁금했던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이해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세계 이념 대립의 시대가 끝나가는 시점은 내 인생을 회고하는 시점과도 비슷하게 맞닿아 있다.
*이 글은 2018년 5월 22일 캐나다 토론토 YYZ Gallery에서 열린 York University, York Centre for Asian Research 초청 Artist Talks :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
접수중정보화교육온라인예약유선예약[온라인]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실기
- 접수기간2025-02-04 00:00~2025-03-07 23:59
- 교육기간2025-03-10~2025-03-28
- 교육시간 19:00 ~ 21:00
- 교육장소ZOOM 활용
-
접수중정보화교육온라인예약유선예약스마트폰 활용
- 접수기간2025-02-04 00:00~2025-03-07 23:59
- 교육기간2025-03-10~2025-03-28
- 교육시간 10:00 ~ 12:00
- 교육장소영동읍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정보화교육장
-
접수중정보화교육온라인예약유선예약컴퓨터 기초&인터넷 활용
- 접수기간2025-02-04 00:00~2025-03-07 23:59
- 교육기간2025-03-10~2025-03-28
- 교육시간 13:30 ~ 15:30
- 교육장소영동읍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정보화교육장
-
접수중정보화교육온라인예약유선예약한글 문서 편집(한글 기초)
- 접수기간2025-02-04 00:00~2025-03-07 23:59
- 교육기간2025-03-10~2025-03-28
- 교육시간 16:00 ~ 18:00
- 교육장소영동읍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정보화교육장
-
교육중정보화교육온라인예약유선예약ITQ한글
- 접수기간2025-01-14 00:00~2025-01-31 23:59
- 교육기간2025-02-03~2025-02-21
- 교육시간 16:00 ~ 18:00
- 교육장소영동읍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정보화교육장
-
교육중정보화교육온라인예약유선예약[온라인]ITQ엑셀
- 접수기간2025-01-14 00:00~2025-01-31 23:59
- 교육기간2025-02-03~2025-02-21
- 교육시간 19:00 ~ 21:00
- 교육장소ZOOM 활용
-
교육중정보화교육온라인예약유선예약스마트폰 활용
- 접수기간2025-01-14 00:00~2025-01-31 23:59
- 교육기간2025-02-03~2025-02-21
- 교육시간 10:00 ~ 12:00
- 교육장소영동읍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정보화교육장
-
교육중정보화교육온라인예약유선예약파워포인트 기초부터 활용까지
- 접수기간2025-01-14 00:00~2025-01-31 23:59
- 교육기간2025-02-03~2025-02-21
- 교육시간 13:30 ~ 15:30
- 교육장소영동읍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정보화교육장
정보화교육
-
접수중정보화교육온라인예약유선예약[온라인]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실기
- 접수기간2025-02-04 00:00~2025-03-07 23:59
- 교육기간2025-03-10~2025-03-28
- 교육시간 19:00 ~ 21:00
- 교육장소ZOOM 활용
-
접수중정보화교육온라인예약유선예약스마트폰 활용
- 접수기간2025-02-04 00:00~2025-03-07 23:59
- 교육기간2025-03-10~2025-03-28
- 교육시간 10:00 ~ 12:00
- 교육장소영동읍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정보화교육장
-
접수중정보화교육온라인예약유선예약컴퓨터 기초&인터넷 활용
- 접수기간2025-02-04 00:00~2025-03-07 23:59
- 교육기간2025-03-10~2025-03-28
- 교육시간 13:30 ~ 15:30
- 교육장소영동읍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정보화교육장
-
접수중정보화교육온라인예약유선예약한글 문서 편집(한글 기초)
- 접수기간2025-02-04 00:00~2025-03-07 23:59
- 교육기간2025-03-10~2025-03-28
- 교육시간 16:00 ~ 18:00
- 교육장소영동읍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정보화교육장
-
교육중정보화교육온라인예약유선예약ITQ한글
- 접수기간2025-01-14 00:00~2025-01-31 23:59
- 교육기간2025-02-03~2025-02-21
- 교육시간 16:00 ~ 18:00
- 교육장소영동읍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정보화교육장
-
교육중정보화교육온라인예약유선예약[온라인]ITQ엑셀
- 접수기간2025-01-14 00:00~2025-01-31 23:59
- 교육기간2025-02-03~2025-02-21
- 교육시간 19:00 ~ 21:00
- 교육장소ZOOM 활용
-
교육중정보화교육온라인예약유선예약스마트폰 활용
- 접수기간2025-01-14 00:00~2025-01-31 23:59
- 교육기간2025-02-03~2025-02-21
- 교육시간 10:00 ~ 12:00
- 교육장소영동읍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정보화교육장
-
교육중정보화교육온라인예약유선예약파워포인트 기초부터 활용까지
- 접수기간2025-01-14 00:00~2025-01-31 23:59
- 교육기간2025-02-03~2025-02-21
- 교육시간 13:30 ~ 15:30
- 교육장소영동읍행정복지센터 3층 주민정보화교육장
평생학습교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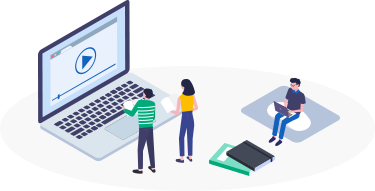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여성회관교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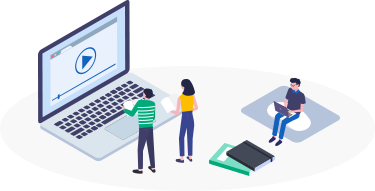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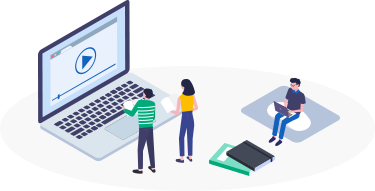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